2024년 6월호 칼럼 무단횡단 보행자가 많은 나라! 그러나 보행자 사고가 없는 나라!
무단횡단 보행자가 많은 나라!
그러나 보행자 사고가 없는 나라!
글 박춘태 박사

교통신호등의 발전과 횡단보도의 탄생은 육상 교통의 발전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1885년, 시간당 16킬로미터의 속력(16㎞/h)을 가졌던 페이턴트 모터바겐(Patent Motorwagen)의 탄생은 획기적인 자동차 시대를 열었다. 자동차는 이동·운송 수단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의 일환으로써 인류문명 발달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다.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자동차가 운행하게 된 것은 불과 126년 전인 1898년이었다. ‘윌리엄 매클린’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서 벤츠 자동차 두 대를 수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각종 차량의 증가는 교통신호등을 양산·발전시켜 왔고 다양한 교통법규를 제정·시행을 견인하고 있다.
뉴질랜드인들은 ‘배려’ ‘존중’ ‘소통’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다문화 국가라는 점에서 상호의견 대립을 피하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자 함이다. 더불어 의사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고자 반언어적(말의 강약, 높낮이 등)·비언어적(몸짓, 손짓, 표정 등) 표현도 자주 사용한다.
대체로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편이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많다는 점이다. 심지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구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다. 게다가 교통신호등이 빨간색 신호등이라도 자동차가 오지 않으면 길을 건너는 경우가 있으며, 어디서나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면만 보면 정말 교통 후진국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보행자 사고가 거의 없다. 무엇 때문인가. 차량우선주의가 아닌, 보행자 우선주의 시행에 따른 결과물이다.
무단횡단을 했던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무단횡단을 많이 했지만 과태료는 한 번도 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인구 500만 명의 뉴질랜드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뉴질랜드의 교통법규를 살펴보자. 원칙적으로 뉴질랜드에서는 2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도로를 무단횡단할 경우 35달러(뉴질랜드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거의 없다.
어느 날 도로에서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경찰차가 있어서 돔(Dom)이라는 경찰관에게 무단횡단에 대한 과태료 적용에 대해 물었다. 그는 “5년 전에 경찰관이 된 이래 무단횡단한 보행자에게 과태료를 물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도로 무단횡단에 대한 법 유지가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다.
얼마 전의 일이다. 도서관에서 나와 공용버스로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 노선도를 보게 되었다. 목적지에 가려면 일단 도로를 건너야 함을 알게 되었다. 양방향 도로를 살펴보니 어떠한 횡단보도도 신호등도 보이지 않는다.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몇 미터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표시조차 보이지 않는다. 횡단보도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함이 밀려온다.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차에 가까운 거리에 있던 한 사람이 자동차가 없는 틈을 타서 무단횡단을 한다. 이런 상황을 보기까지 했지만 일단 횡단보도가 나올 때까지 걷기로 했다. 15분 정도 가니창고형 매장이 보인다. 매장 밖에서는 자동차에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직접 양손에 들고 이동한다. 잠시 후 그들 중 일행인 듯한 몇 명이 양쪽 도로를 유심히 살핀다. 자동차가 없는 틈을 이용해 무단횡단하려는 듯 보인다. 드디어 무단횡단을 하는데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도로 표면보다 훨씬 높은 구역으로 가서 횡단하는 게 아닌가. 재빨리 도로를 건너 일행을 뒤쫓아 가서 그 설치물은 무엇이며 용도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1980년대 보행자 우선주의 교통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보행자 대피섬(Pedestrian Refuge Island)’이라고 한다. 주위에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사람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만든 설치물로 길을 건너는 동안 도로 중간에서 안전하게 기다리는 구역이라고 한다. 보행자의 편의성을 배려한 정책이라는 느낌이 든다.
뉴질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보행자 사고가 없는 나라로 손꼽힌다. 어떤 노력을 하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 첫째,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면 무조건 차를 세운다. 이는 무단횡단 여부와 관계없다. 차를 세운 후 운전자는 보행자들에게 먼저 건너가라는 손짓을 한다. 둘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는 거리를 줄였다는 점이다. 횡단거리의 축소는 양쪽 인도를 차로 쪽으로 넓힘으로써 이뤄졌는데, 이런 결과로 횡단보도가 있는 지점에서는 자연스럽게 도로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인지한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에 가까이 접근하면서 더욱 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뉴질랜드를 보행자 사고가 없는 나라로 만든 동인이었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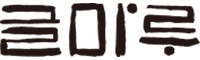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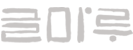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