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호 칼럼 문화 자산으로서의 뉴질랜드 지역명과 도로명
문화 자산으로서의
뉴질랜드 지역명과 도로명
글 박춘태(중국 북경화지아대학교 기업관리대학 교수)

세계 곳곳에는 다양한 이름의 국가명, 지역명과 도로명이 있다. 같은 국가 내에서도 같은 도로명이나 같은 지역명이 서로 다른 도시에 있는가 하면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도로명이나 지역명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역사적·시대적인 관점에서 국가 간 정치, 경제, 군사, 문화는 물론 유입 민족과 관련돼 있거나 역사적인 인물들이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지역 이름이나 도로의 이름을 정하는 이유는 인간이 사회화를 이뤄 사는 데 있어 생활의 편리함과 다양한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인류가 지명, 도로명을 정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사용해 온 시기는 고대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렇기에 인류삶의 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이름에는 인류의 생활 모습, 생활 용어, 어원, 풍속, 사고방식과 의지 또한 담겨 있기에 귀중한 문화 자산이자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지명의 경우 분류 방법이 다양한데 행정적으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지명, 지형에 쓰인 지명, 생활한 장소와 생활 양식을 나타내는 지명, 글 또는 언어의 진화에 의해 나타난 지명 등으로 분류된다.

뉴질랜드 국가 이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섬
그야말로 황무지!!
지명은 보편적으로 사람 및 동물에 대한 것이 식물보다 훨씬 많으며 동물 중에는 상상의 동물도 포함될 정도로 광범위하다. 뉴질랜드는 1790년경부터 유럽인의 이주가 시작된 후 지명 및 도로명에서 영국에서 따 온 것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으로 인물, 사건, 지역, 장소 그리고 뉴질랜드에 도착한 초창기 배의 이름 등에서였다.
뉴질랜드(New Zealand)라는 국가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642년 유럽 탐험가 아벨 타스만이 뉴질랜드를 발견하기 전에 그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은 마오리족이었다. 그들은 약 1000년 전에 태평양 여러 섬에서 여러 척의 배를 타고 우여곡절 끝에 뉴질랜드로 오게 되었다. 당시 그들이 도착한 섬의 해변은 황량하기만 했다. 거친 파도, 길고 무성한 잡초만이 그들을 반겨주었다. 믿을 수 없는 풍경, 그야말로 황무지였다. 모든 것을 개척해야 했기에 암담하기 짝이 없었지만 높고 푸른 하늘에 펼쳐진 구름을 보는 순간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다. “흰 구름을 많이 봐 왔지만 저렇게 길게 펼쳐진 흰 구름은 처음 본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었던 ‘긴 흰 구름’의 상황이 늘 지속되는 데또 한번 놀라게 되었다. 마오리족들은 땅 이름을 짓기로 했지만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착안한 마오리족은 땅 이름을 ‘긴 흰 구름의 땅’이라고 자연스럽게 불렀다. 마오리어로는 ‘아오테아로아(Aotearoa)’로 오늘날에도 영어 이름 ‘뉴질랜드’와 더불어 널리 쓰이고 있다. ‘뉴질랜드’라는 국가 이름은 유럽의 탐험가에 의해 땅을 발견된 이후에 만들어졌다. 네덜란드에서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지었는데 ‘새로운(new) 바다(sea) 땅(land)’이라는 의미를 기반으로 해 이를 조합·일부 변형하여 만든 이름이 뉴질랜드다. 또 ‘질란드’라는 지명이 네덜란드에 있어서 거기서 따온 것이라는 설도 있다. 결국 ‘뉴질랜드’라는 영어 이름은 마오리어 ‘아오테아로아(Aotearoa)’에 이은 후속 국가명으로 탄생했다.
19세기 유럽인들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마오리 외에 많은 지명 또는 도로명은 영국에서 따 오게 되었다. 아울러 마오리족의 정착과 더불어 지어진 초기 마오리어 이름의 대부분이 영어로 대체되었다. 뉴질랜드 수도인 웰링턴(Wellington)은 영국의 장군인 웰링턴의 이름을 딴 것이며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뉴 브라이턴(New Brighton) 해변’은 영국 ‘뉴 브라이튼’에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또 뉴질랜드 남섬 최대의 교육도시 ‘더니든(Dunedin)’이라는 도시는 영국의 에든버러의 옛 지명이 ‘더니든’이라서 여기서 따 온지명이다.

어원이 담긴 지명들
‘스톤필드(Stone Field)’
추위 막기 위한 식물 재배
돌담 쌓아 경계벽 만들어
노력한 결과 식물 성장
따듯한 마을 환경 조성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지역 도로 중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로들이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는 1945년 6월 1일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꽤 많은 희생자를냈다. 사람들은 희생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실천적 행동에 감명을 받는다. 크라이스트처치 지역만 해도 무려 15개의 도로가 캔터베리(Canterbury) 출신으로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던 희생자들을 기리고자 명명되었다. 대표적인 기념 도로로는 세인트 제임스, 스트로완, 캔윈, 란스버리, 알파, 스콧스톤, 콘델 등이 있다. 이들 도로에는 도로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명판에 새겨져 있어서 내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필자에게 특별한 인상으로 기억된 곳이 있다. 어느 날 문화적 경험을 하고자 크라이스트 처치 지역에 있는 파파누이(Papanui)라는 마을을 갔다. 특이한 이름의 도로를 보았는데 ‘세인트 제임스 애비뉴(St James Avenue)’라고 돼 있었다. 또 근처에는 공원도 조성돼 있었는데 수십 그루의 재질이 단단한 참나무가 심겨 있었다. 참나무를 심은 이유는 참나무가 속이 튼실하고 단단함을 상징하고 있기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캔터베리 출신 희생자들을 기리는 데 적합한 수종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번엔 어원이 담긴 지명을 보자. 초기에 마오리 정착민은 강한 바람과 수시로 변화하는 날씨에 정착이 힘들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힘든 것은 추운 겨울 날씨를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큰 과제였다. 그들은 개척자의 정신으로 식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추울 때는 식물이 잘 자라지 못했다. 바람을 피하고 추위를 막아주는 것이 식물재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들은 호숫가에 가서 닥치는 대로 자갈이나 돌을 가져와 돌담을 쌓고 경계벽을 쌓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식물이 성장하기에 따뜻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마을이 ‘스톤필드(Stone Field)’라는 마을이다. 또 후에 이 마을을 유럽 정착민들은 채석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어떤 때는 뉴질랜드 도로 건설에 필요한 전체 골재 중 7% 정도를 생산한 적도 있다. 그런면이 있었기에 ‘스톤필드’라고 불리는 데 아무런 어색함이 없다.
크라이스트처치에 ‘메모리얼(Memorial) 애비뉴’라는 도로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희생한 공군 장병을 기리는 도로다. 지난 1959년에 공식적으로 도로명을 부여한 사람은 ‘번사이드 로드 메모리얼 하이웨이 위원회(Burnside Road Memorial Highway Committee)’의 ‘윌리암 레잉(William Laing)’이라는 회장이다. 또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의 ‘안작 드라이브(Anzac Drive)’는 해외에서 분쟁과 전쟁에서 희생된 크라이스트처치 버우드(Burwood) 지역과 뉴브라이턴(New Brighton) 지역 출신 주민들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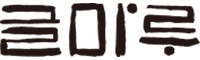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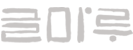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