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호 칼럼 뉴질랜드인들의 자연친화적·검소한 생활
뉴질랜드인들의
자연친화적·검소한 생활
글 박춘태(중국 북경화지아대학교 기업관리대학 교수)
1999년 뉴질랜드 남섬 남쪽 끝에 있는 더나든(Dunedin)이라는 도시에서 필자는 유학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더니든의 중심가인 옥타곤(Octagon)을 갔다. 만나기로 미리 약속한 대학생 2명을 만나려고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중 한 명이 맨발로 오고 있는 게 아닌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신발이 없거나 오는 도중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신발을 잃어버렸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왜 맨발로 다니느냐고 물으니 ‘거리가 깨끗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는 거리가 깨끗하다니. 이해가 되질 않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만 믿었다. 그게 아니라면 자연친화적 생활이라고 믿었다.
그 후 20여 년이 지났다. 올해 9월 초. 세계 많은 국가에서는 마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해방을 맞듯 국경을 개방하게 됐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는 출입국 절차 및 격리 상황을 예전에 비해 상당히 간소화시켰다. 바람직한 일이다. 덩달아 뉴질랜드인의 일상생활도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으며 많은 해외 유입객이 들어옴으로써 각 지역의 쇼핑몰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9월 어느 날 크라이스트처치 지역 ‘카운트다운(countdown)’ 쇼핑몰을 갔다. 그런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스팔트 도로에서 또는 쇼핑몰 안에서 맨발로 활보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한두 명도 아닌 여러 명이. 그들의 행보가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이채롭기까지 하다. 심지어 한 가족이 모두 맨발로 걸어 다니기도 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으니 일상의 한 부분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걱정이 되었다. 아무리 쇼핑몰이 안전성과 위생에 있어서 흠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칫 실수로 다칠 수도 있다. 바닥에 뾰족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쏟아진 액체가 있으면 미끄러질 수도 있다. 물론 그들의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는 습성이 있기에 쓰레기나 공해·위험 물질을 아무 데나 버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실 발이 다칠 확률이 높지는 않다. 필자가 그들에게 왜 맨발로 다니는지를 물었다 놀랍게도 ‘맨발이 편하다’라고 했다.
뉴질랜드 웰링턴 식물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
쇼핑몰 출입 규정이 몰 입구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규정 어느 곳을 찾아봐도 맨발로다닐 수 있다는 쇼핑몰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현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진행되고 있었다. 20여 년 전에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데 놀랐다.
이번엔 그들의 검소한 생활에 대해 보자. 뉴질랜드인들의 쇼핑문화는 고급스러운 명품을 찾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브랜드가 인지도를 얻기에도 한계가 있다. 고가의 제품이 있기는 하지만 다양하지 않다. 이는 명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선호할까. 유행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며 실용적이면서 저가 제품을 찾으며 중고제품의 거래가 활성화돼 있다. 한마디로 보수적 쇼핑문화라 할 수 있다. 중고제품의 거래는 전문 가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집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일명 ‘게라지 세일(Garage Sale)’이라 한다. 판매자는 한동안 써 왔던 물건 또는 쓰지 않았던 물건들을 모아서 고객들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파는 것이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내의 한 상점 (출처: 뉴시스)
중고제품 취급 가게 중 ‘호스피스샵(Hospice Shop)’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품 판매액을 취약한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기금으로 쓴다.
아무리 보잘 것 없이 보이는 물건일지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게 뉴질랜드인들의 소비문화다.
어느 날 필자가 크라이스트처치 시내에서 중고품 전용가게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호기심에서 가게 안을 들어가게 되었다. 외관이 크고 깔끔해서 중고제품 취급 가게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곳에는 쓰지 않은 물건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맡기면 우선 점원들이 쓸 수 있는 물건인지를 판단한다. 이후 물건 값을 정해 이익금의 50%를 위탁자에게 준다. 중고제품 취급 가게 중 ‘호스피스샵(Hospice Shop)’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품 판매액을 취약한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기금으로 쓴다. 아무리 보잘 것 없이 보이는 물건일지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게 뉴질랜드인들의 소비문화다.
재활용하는 소비문화에서 제품의 소중함, 환경의 소중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고급스러운 명품은 그들을 설레게 하지 않는다. 중고제품이라도 원하는 물건, 적절한 가격이 형성돼 있으면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뉴질랜드의 겨울은 일반적으로 매서운 추위가 없다. 특히 북섬의 경우 영하권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겨울에도 얇은 옷만 입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온화한 기후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한마디로 몸에 배인 검소함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사회화를 이뤄 살아간다. 다른 예로 그들의 장례식 복장에서도 검소함을 찾을 수 있다. 유족이 입는 상복이나 조문객들의 복장을 보면 고정된 것이 아닌 자유롭게 입는다.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색깔에 상관없이 옷을 입기도 하며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는 평소 입던 복장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또 장례식 후 문화를 보면 고인이 사용하던 물건은 나누어 갖는다. 유품을 나누어 갖는 사람은 형제, 자매, 자녀, 손자, 조카 등이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나 친지에게 주기도 한다. 이렇듯 뉴질랜드인들의 일상생활은 자연친화적이고 다원주의를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를 이루며 다문화, 다원주의를 발전시켜 국가 성장의 동력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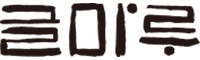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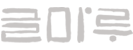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