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호 칼럼 작은 바구니, 큰 신뢰와 배려 뉴질랜드 대형마트에서 찾은 공동체의 미학
작은 바구니, 큰 신뢰와 배려
뉴질랜드 대형마트에서 찾은 공동체의 미학
글·사진 박춘태
뉴질랜드의 한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풍경이 있다. 바로 과일 코너 한 켠에 놓인 나무 바구니와 그 위의 안내문이다.
“FREE FRUIT FOR KIDS.” “Let your kids snack on a FREE piece of fruit while you shop.”
아이들을 위한 무료 과일. 쇼핑하는 동안 아이들이 과일을 하나 집어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문구는 그 자체로 공동체의 철학을 담고 있다.
사과, 바나나, 키위 등 신선한 과일이 정갈하게 담긴 바구니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놓여 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다가가 과일을 집어 들고 부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쇼핑을 하는 동안 아이가 투정을 부리거나 지루해할 때, 바구니에서 과일 하나를 건네주면 마트의 풍경은 한층 평화로워진다. 하지만 이 바구니가 전하는 메시지는 육아의 팁이나 고객 서비스에 그치지 않는다. 이 작은 바구니는 공동체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신뢰와 배려의 상징이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곳은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대형마트 체인인 ‘울워스(Woolworths)’다. 2015년 10월, 한 매장에서 시작된 이 바구니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뉴질랜드 전역의 마트에서 볼 수 있다.

“아이들은 과일을 먹을 기회를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한 이 정책은 고객 만족을 넘어 건강한 식습관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회적 실천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흔히 ‘공짜’라는 단어에 경계심을 갖는다. 특히 상업적 공간인 마트에서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그 ‘공짜’를 통해 신뢰를 실험한다. 감시하는 사람도, 복잡한 규칙도 없다. 그저 바구니를 놓아두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과일을 집어 들도록 기다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구니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해진 만큼만 가져간다. 남을 위한 몫을 남기는 조용한 절제와 배려가 이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이 과일 바구니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가?” 소비와 효율이 중심이 된 현대 사회에서, 이 바구니는 신뢰와 나눔이라는 오래된 가치를 다시금 일깨운다. 아이가 사과 하나를 집어 들고 부모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없어도, 그들의 표정에는 감사와 따뜻함이 흐른다. 그 순간, 마트는 소비의 공간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신뢰로 연결되는 공동체의 장이 된다.
뉴질랜드의 일상 속에는 이런 소박한 장면들이 이어진다. 놀이터에서 어울리는 다양한 가족들, 마트에서 과일을 손에 든 아이들. 별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모두를 위한 사회’라는 메시지가 스며 있다. 이 작고 소박한 제도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천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아이가 있다. 아이의 손에 건네진 과일 하나가 언젠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의 씨앗이 되길 바라는 어른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
이 바구니가 던지는 질문은 그저 “과일을 먹을래?”가 아니다.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을 물려주고 싶은가?”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이다. 뉴질랜드의 마트는 이 질문에 대해 신뢰와 자율로 답한다. 바구니를 채워두고 아이들이 스스로 다가와 과일을 고르도록 내버려 둔다. 때로는 아이가 두 개를 집으려 할 때 부모가 조용히 제지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친구와 나누기도 한다.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사실 이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신뢰의 문화가 깔려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욕심을 내거나,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다면 이 바구니는 금세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구니의 의미를 존중한다. 어른들은 아이에게 “한 개만 집자” “다른 친구들도 먹어야 해”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절제와 배려를 배운다. 바구니가 비어 있으면, 마트직원이 다시 채워 넣는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서로를 의심하지 않는다. 이 작은 신뢰의 실천이 쌓여,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은 이 바구니를 통해 과일을 얻는 것 이상의 경험을 한다. ‘공짜’라는 단어가 주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규범과 배려, 그리고 신뢰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힌다. 부모 역시 이 바구니를 통해 작은 감동을 느낀다. 아이가 과일을 집어 들 때, 자신도 모르게 “고맙다”는 마음이 든다. 마트라는 상업적 공간이 잠시나마 공동체의 따뜻함을 전하는 장소로 변한다.
뉴질랜드의 마트에서 시작된 이 나눔은, 사실 일상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이런 풍경은 뉴질랜드가 추구하는 ‘포용’과 ‘공존’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런 면에서 마트의 과일 바구니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작은 혜택이지만, 그 안에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 바구니가 오래도록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트는 신선한 과일을 꾸준히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제도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 특히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바구니의 의미를 설명하고, 절제와 배려의 가치를 일깨워야 한다.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더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변화나 제도를 통해 사회가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마트의 과일 바구니처럼, 누군가를 위한 작은 배려와 신뢰의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된다. 이 경험이 쌓여 언젠가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씨앗이 된다.
공동체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를 주고받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이 작은 바구니는 오늘도 말없이 아이들을 기다린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인다. “아이 한명의 손에 과일 하나를 쥐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일지도 모른다.”
이 바구니가 전하는 신뢰와 나눔의 메시지는 오늘도 뉴질랜드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꿈꾸고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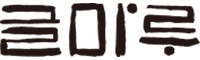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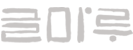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