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호 문화 여러분 “폭싹 속았수다”
여러분 “폭싹 속았수다”
글 백은영
처음 이 드라마의 제목을 들었을 때 ‘완전히 속았다’ ‘크게 속았다’는 의미인 줄 알았다.
속으로 ‘드라마 제목 한번 재미지네’라고 생각했다.
처음엔 제목에 크게 속았고,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한 시대를 묵묵히 잘 견뎌온 우리네 부모님 생각에 이런 말이 절로 나왔다. “아버지, 어머니 폭싹 속았수다.”
제주·여자 그리고 바다
지난 3월 7일 첫 방영을 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김원석 연출, 임상춘 작가)>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폭싹 속았수다’는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의 제주 방언이다.
드라마는 1950년대 제주에서 태어난 ‘요망진 반항아’ 애순이(아이유 분)와 ‘팔불출 무쇠’ 관식(박보검 분)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로 풀어냈다. 밤톨처럼, 알토란처럼 매끌매끌하니 그저 바라만 봐도 어여쁜 어린 시절부터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무르익어 가는 노년기까지를 시대상과 함께 잘 그려낸 드라마다.
드라마의 배경이 된 1950~1960년대에 제주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그 시절, 제주에서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잠녀(해녀)로 평생 바당(바다)과 싸워야 한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잠녀의 물질에 식구들의 생계가 달렸던 시절이었다.

<폭싹 속았수다> 가을 포스터
허나 바다가 어디 그리 쉽게 제 것을 내어주던가. 물질이란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다. 잠녀의 숨비소리엔 당시 제주 여성들의 고달프고 애달픈 삶이 묻어 있었다. 그렇기에 딸이 태어나면 절대 잠녀는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또한 어멍(어머니)의 마음이었다.
<폭싹 속았수다>의 주인공 애순의 어멍 전광례(염혜란 분) 또한 그랬다. 똑똑하고 야무진 딸 애순을 육지에 있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소원이었다.
말은 투박하지만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육지로 가고 싶은 마음은 애순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무조건 서울놈한테 시집갈 거야. 섬놈한테는 절대! 급기야 노스탤지어도 모르는 놈은 절대! 네버!”라고 입버릇처럼 말할 정도로 제주가, 아니 제주의 바다가 싫었다.
제주의 바당(바다)에 아방(아버지), 어멍(어머니)을 너무도 일찍 잃었다. 관식과 결혼 후 얻은 막내아들 동명까지 제주의 바당에 잃은 뒤로는 “그놈의 바다 꼴도 보기 싫다”며 바다를 등지고 앉았다.
드라마 속 애순이의 삶은 어릴 때부터 참으로 고달팠다. 바당에 아방을 잃고, 새롭게 가정을 꾸린 어멍이 보고 싶어 하루가 멀다 하고 고개 넘어 어멍을 보러갔다. 어멍과 다시 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멍마저 잠녀의 직업병인 숨병(감압병)에 잃고 말았다. 애순이 제주의 바당을 벗어나 육지로 떠나고 싶은 것은 당연했다. 그럼에도 애순이 제주에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코흘리개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곁을 지켰던 관식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무리 박복한 인생이래도 어디 인생이 혹독한 겨울만 같겠는가.

‘호로록 봄’이 있고 ‘꽈랑꽈랑 여름’이 있으며 ‘자락자락 가을’ 지나 ‘펠롱펠롱 겨울’이 있기에 녹록치 않은 인생, 그렇게 살아지는 게 아닐까. “살민 살아진다(살면 살아진다)”는 말처럼 말이다.
연기·연출·극본, 딱 맞은 삼박자
<폭싹 속았수다>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에피소드마다 눈물을 쏙 빼는 감성적인 서사에 있다. 그렇다고 일부러 눈물을 쥐어짜는 것은 아니다. ‘툭’하고 던지는 말 한마디에, 억세게만 보이는 ‘어멍’이 딸을 위해 옷을 곱게 차려입고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륵 흘러내린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던가. 자식을 위해서 라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차릴 체면도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물질하는 어멍이 힘들까봐, 어멍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시로 꾹꾹 놀러 쓴 딸 애순의 마음을 알기에, 또 그런 딸이 너무도 고맙고 애달파 눈물을 훔치던 어멍의 모습에, 같이 울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드라마가 가진 힘이다.
주인공인 애순과 관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인생 이야기는 비단 그들만의 것이 아닌 그 시대를 살았던, 아니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의 인생 이야기이기도 하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공개 직후 넷플릭스 글로벌 TOP10 시리즈에 진입하며 화제를 모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외에도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제주도의 사계와 1960년대부터 202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굵직한 사건들과 문화, 시대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녹여낸 것도 눈여겨볼만하다.

또한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의 연기 또한 하나같이 찰떡이다. 주연, 조연이 따로 없을 정도로 모든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은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여기에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집필한 임상춘 작가의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감성이 담긴 대사와 스토리가 더해졌으니 말 다했다.
무엇보다 <미생> <나의 아저씨> 등을 연출한 김원석 감독이 이를 섬세하게 잘 풀어내면서 드라마는 스토리와 영상미, 배우들의 연기력까지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육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제주도 사투리도 인기 요인 중 하나가 됐다. 드라마를 볼 때 “무슨 말이지?”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생소한 단어들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숙제가 됐다. 드라마 속 사투리를 설명해주는 영상이 덩달아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해준다.
에피소드 제목으로 나온 <호로록 봄>에서 ‘호로록’은 ‘빨리’라는 뜻이며, <꽈랑꽈랑 여름>에서 ‘꽈랑꽈랑’은 ‘햇볕이 쨍쨍하다’, <자락자락 가을>에서 ‘자락자락’은 ‘주렁주렁’, <펠롱펠롱 겨울>에서 ‘펠롱펠롱’은 빛이 잠깐잠깐 연해서 비치는 모양으로 ‘반짝반짝’을 의미한다.
<폭싹 속았수다>는 ‘웰메이드(well-made)’ 드라마다. 누군가는 그들의 삶에 공감하고, 누군가는 알지 못했던 시절에 대한 하나의 에피소드로 기억되겠지만, 이 드라마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눈가가 ‘펠롱펠롱’해졌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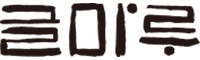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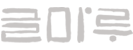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