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호 문화 새로운 국보급 ‘백제 금동미륵반가사유상’ 발견 백제의 미소 방불
새로운 국보급
‘백제 금동미륵반가사유상’ 발견
백제의 미소 방불
부여 정림사지 출토 토용 상호 닮아… 6세기 중반 조성 추정
17㎝ 정교한 조형미, 신체 각부와 대좌 등 잘 보존
글 백은영

미소를 가득 머금은 새로운 백제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이 발견됐다.
크기는 높이 17㎝, 두고 2㎝, 견폭 4㎝, 대좌고 7.5㎝, 저경 6×6㎝ 로
소형이다. (제공: 이재준 고문)
삼국시대 금동제 미륵반가사유상은 우리나라 고대 불교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륵반가사유상은 다른 불상과는 확연히 다른 독특한 형식을 지녔으며 남아있는 유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 독특한 형식이 갖는 아름다움은 세계적으로도 그 조형미에 대해 찬사를 받고 있다.
미소를 가득 머금은 새로운 백제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이 발견됐다. 백제의 미소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 크기는 높이 17㎝, 두고 2㎝, 견폭 4㎝, 대좌고 7.5㎝, 저경 6×6㎝ 로 소형이다.
이 반가사유상은 신체 각부와 대좌 등이 잘 보존돼 있어 리움미술관 소장으로 국보로 지정된 고구려 반가사유상에 비해 양호하다. 두광은 상실되고 머리 뒤편에 막대형의 작은 꽂이만 남아있다. 이 반가사유상은 한국역사유적연구원 이재준 고문이 지난해 9월 학회 논문으로 발표, 최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불상은 머리에는 복두형에 가까운 보관(寶冠)을 썼는데 이 고문은 이 같은 양식이 6~7세기 한일 반가사유상에서 많이 찾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면 장식은 마모가 있어 화불(化佛)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같은 양식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반가사유상 그리고 일본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반가사유상 가운데 비슷한 예가 조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1962-2)(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 고문은 논문에서 “상호가 지닌 잔잔한 미소는 일품이며 국보 미륵보살반가사유상
의 입가에 잔잔히 흐르는 미소와 방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눈꼬리는 올라가 있으
며 볼은 소년처럼 통통하게 살이 쪄 있다. 삼국시대 백제의 미소년을 떠올리게 하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얼굴”이라면서 “북위나 남조 보살상에 나타나는 미소와 부여 정
림사지 출토 토용(土俑)의 상호를 닮아있다. 주성 시기는 6세기 중반 백제 성왕대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소를 가득 머금은 새로운 백제 금동미륵반가사유상(왼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이 발견됐다. 백제의 미소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
크기는 높이 17㎝, 두고 2㎝, 견폭 4㎝, 대좌고 7.5㎝, 저경 6x6㎝ 로 소형이다. (왼쪽부터) 백제 정림사지 출토 토용 얼굴상,
부여 정림사지 출토 백제 토용의 상호를 닮은 새로 발견된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전체 모습과 상호 클로즈업,
부여 부소산 출토 납석제 반가사유상, 국보로 지정된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제공: 이재준 고문, 국립중앙박물관)
목에 장식된 심엽형(心葉形)의 경식과 복부의 버클 장식도 국보로 지정된 반가사유상을 닮아 있다. 이 고문은 “비교적 큰 버클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하체 부분은 부소산에서 출토된 납석제 반가사유상과 비슷하다”면서 “하단부의 옷 문양은 돌아가며 Q자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국보로 지정된 미륵반가사유상의 형식과 같다”고 설명했다.
도금 불상이기 때문에 아직도 군데군데 남은 금은 찬란한 빛을 띠고 있다. 논문에는 전문기관의 비파괴 검사를 통해 이 부분이 금과 은으로 밝혀졌음을 명시했다. 아말감 도금시 동과 은을 섞어 주조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고문은 “삼국시대 백제에서는 금제 공예품과 금판경을 조성할때도 은·동 합금판에 금도금을 한 실례가 있다. 은·동판에 아말감으로 도금을 한 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된 삼국시대 반가사유상이 있다”고 주석을 달았다.
미륵보살은 민중을 현실의 고통에서 구제해 준다는 미래불이다. 삼국시대 끊임없는 전쟁으로 민중의 삶이 도탄에 빠졌을 때 언젠가는 나타나 구제해줄 것이라는 구호신이었다. 이 고문은 국립부여박물관에는 부소산에서 출토된 납석제 파불 1점이 유일해 이 백제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의 국가유산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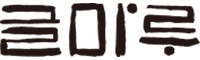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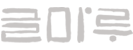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