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호 역사 마을의 수호신이자 이정표였던 ‘장승’
마을의 수호신이자 이정표였던 ‘장승’
글 백은영
사천 가산리 석장승 중 하신장 남장승 정면
장승 또는 벅수는 한국인의 마을 공동체 신앙과 풍속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이다. 마을 어귀나 산길, 사찰 입구에 서 있는 이 투박한 목조 혹은 석조 조형물은 단순한 수호신을 넘어선 복합적 상징체다. 장승은 잡귀를 몰아내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대상이었으며, 동시에 공동체의 경계와 규범, 질서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민속 신앙의 중심에 있었다.
장승의 기원
통나무나 돌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새겨 마을 입구나 길가에 세운 목상이나 석상을 가리키는 신목(神木). 장승의 정확한 기원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선사시대 제의 유적에서 장승과 유사한 조형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그 뿌리는 매우 깊다.
통상적으로는 장승이 고대의 남근숭배에서 유래됐다는 설과 사찰의 토지 경계 표시에서 나온 것이라는 장생고표지설(長生庫標識說), 솟대·선돌·서낭당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고유민속 기원설 등이 있다. 또한 퉁구스 기원설·남방 벼농사 기원설·환태평양 기원설 등과 같은 비교민속 기원설도 존재한다.
문헌상으로는 전남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비(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의 비명에 신라 경덕왕 18(759)년의 ‘장생표주’에 대한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의 기록으로는 943년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북 청도(淸道) 운문사(雲門寺)의 장생(長生), 1085(고려 의종 2년)년 경남 양산 통도사국장생석표(通度寺國長生石標), 전남 영암 도갑사(道岬寺)의 국장생과 황장생, 1689년의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의 석장승, 1725년의 전북 남원군 산내면 입석리 남원실상사석장승(南原實相寺石長栍) 등이 있다.
또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노표(路標)와 관련해 후(堠, 이정(里程)을 표시하기 위해 쌓던 조금 높직한 평지)에 이수(里數)와 지명을 기록해 10리·30리마다 후를 세우도록 법제화됐고, 이후는 노표 외에도 장생(長栍)을 지칭하기도 했다.
남원 서천리 당산 전경(1993년 촬영한 남원 서천리 당산의 돌장승 2기의 모습)
성현의 <용재총화(慵齋叢話)>, 김수장의 <해동가요(海東歌謠)> 등에는 후와 장생을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6세기 이후 장승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됐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장승이 관청의 통행로 구분, 지방 간의 경계표시로도 활용됐으며, 불교적 색채가 가미되면서 사찰과 연결된 도량 입구에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에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등의 명문이 등장하며,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남녀 한 쌍의 장승이 표준화된 형태로 확립됐다. 즉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는 장승의 형태와 역할이 더욱 정형화돼 민간 신앙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지역성과 상징성의 조화
장승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적 다양성에 있다.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 지역에서는 ‘벅수’나 ‘법수’라는 명칭이 사용되며, 충청도에서는 ‘수살목’ ‘수살막이’로 불린다. 제주도의 돌하르방 또한 장승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형물이다.
나무를 소재로 한 장승은 주로 해학적이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석조 장승은 무표정하거나 근엄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동체가 외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환대와 경계의 이중성을 반영한다. 특히 해학적 얼굴 표현은 풍자와 유희의 문화 속에 살아있는 민중의 삶을 반영한다.

화천 성불사지 석장승

함양 벽송사 목장승

대장군. 남원 실상사 석장승
장승의 크기 또한 제각각이다. 어린이 키보다 작은 것도 있고 성인의 키를 훌쩍 넘은 장승도 있다. 이는 마을의 경제력, 신앙의 성향, 조각가의 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장승은 예술작품이 아닌 실용신앙의 도구였기에 형태보다 기능이 우선됐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장승은 조선시대 이후 지역 수호신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제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매년 정월대보름에는 장승 앞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가 열렸고, 이러한 의례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제로 기능했다. 비록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이러한 민속신앙은 급속히 쇠퇴했으나 장승은 20세기 후반부터 문화재로 지정되며 문화유산으로서의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전라북도 남원 실상사 앞에 서 있는 석장승은 조선 후기 조성된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징을 강조한 조각 양식이 특징이다. 이는 음양 조화의 상징이자 다산, 풍요, 생명의 기운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석장승은 1969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부안 죽림리 석장승 중 남장승 정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전라남도 장흥 방촌리의 석장승은 여전히 마을 수호신으로 기능하며, 매년 정기적인 장승제를 통해 마을 공동체의 신앙을 계승하기도 했다.
장승은 세운 목적이나 위치에 따라 여러 기능을 지니고 있다. 경계표나 이정표의 구실과 함께 잡귀와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의 역할은 물론 개인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대상으로서의 신앙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렇듯 장승은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거나 손을 대면 안 되는 존재였다. 어렸을 적 어르신들이 “절대 손대면 안 돼”라며 무섭게 주의를 주던 기억이 있다.
하늘 위로 솟을 듯 치켜 올라간, 무섭게 부릅뜬 눈과 주먹코, 크게 찢어진 입모양은 무섭기까지 하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모를 인자함을 지니고 있어 보는 이들에 따라 익살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장승’이다. 잡귀를 물리치고 마을과 마을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장승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예술과 문화로 함께하다
장승은 민중문화의 한 상징으로서 속담이나 수수께끼·설화·지명 등에도 잘 반영돼 있다. 대표적인 속담 중 하나는 “구척 장승같다.”가 있다. 키가 멋없이 큰 사람을 빗댄 말이다. 또 멍하게 서 있는 사람을 “벅수같이 멍하니 서 있다.”라고 한다든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할 때 “장승 입에다 밀가루를 발라놓고 국수 값 내라고 한다.” 등의 속담이 전해 내려온다.
수수께끼로는 “입이 크되 말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등이 있다.
현대에 들어 장승은 예술적, 교육적 소재로도 주목받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108호 목조각 이수자이자 장승 장인인 김종흥 씨는 전통적인 기법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장승 조각으로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는 장승이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소통 가능한 문화 코드임을 입증한다.
정동진 조각공원에는 그가 만든 장승 150기가 설치돼 있으며, 국회의사당 내 국회회관에서 장승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 앞 평화공원 내에도 장승 30기와 솟대 20개가 설치돼 있는 등 전국 각지에 그가 만든 장승이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고 있다.
이제 장승은 더 이상 마을 어귀에만 서 있는 조형물이 아니다. 장승은 공동체의 역사, 가치, 신념을 담고 있는 상징이자 전통과 현재를 잇는 가교다. 언젠가 장승을 보게 된다면 중 남장승 정면 유심히 그 표정을 다시 들여다보자. 거기엔 우리가 잊고 있던 공동체의 얼굴이 있다.

태백산 석장승(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영암 메밀방죽 옆 장승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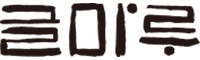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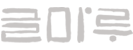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