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호 인물 ‘풍납토성 출토 와당’의 재해석
‘풍납토성 출토 와당’의 재해석
글·사진 이재준 정리 백은영
서울 한강변에 자리 잡은 사적 제11호 풍납토성과 사적 제297호 몽촌토성. 두 토성은 한성 백제시대 첫 도읍지인 하남 위례성으로 비정되는 유적이다. 풍납토성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발굴을 통해 여러 점의 백제 고대 와당들을 찾았으나 이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했다. 한성백제박물관에 소장된 와당에 대한 설명도 정확하지가 못하다.
한국역사유적연구원 이재준 고문은 지난 50년간 한·중 고대 와당을 연구해온 고미술학자로 본지에 풍납동 와당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

풍납토성 항공사진. 도면의 초록색 부분이
현재 남아 있는 성벽 부분이다.
중국 갑골문 자료. 방(邦)과 풍(豊) 문양
인면문 와당과 수막새
풍납토성에서 발굴로 출토된 와당 가운데 한성백제시대 <삼국사기>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물이 있어 주목된다. 이와당들은 한성백제박물관 제2전시실에 있으며 일반이 쉽게 관람할 수 있다.
와당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이 바로 중국 동진(東晉)시기 유행한 ‘인면문 와당’이다. 인면문이란 사람의 얼굴을 가리킨다. 이 시기는 육조시대(六朝時代, 229~589)로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는 4세기 백제에 불교를 전해준 이역 출신 고승이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백제는 침류왕 원년(384)에 남중국의 동진으로부터 서역 출신의 승려 마라난타가 오자 국왕은 그를 궁궐에 맞아들여 극진히 공경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이듬해인 385년에는 불사를 한산에 창건하고 도승 10명을 두었다고 기록된다. 한산은 지금의 광진구와 구리시에 접해 있는 아차산으로 비정되는데 아직까지 초기 불교유적은 찾아지지 않았다.

중국 출토 동진시기 인면문 와당
인면문 와당은 우리가 흔히 도깨비기와(혹은 용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기와로 중국에서는 대략 4세기 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중국 남경박물관에 많은 양이 전시되어 있다. 풍납토성 인면문 와당의 눈은 치켜 올라가 있으며 코는 크고 수염이 표현되어 동진 와당에 비해 활달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풍납토성 안 건물지에서는 이형의 수막새가 찾아졌다. 발굴조사를 맡은 박물관 측에서는 이 유적을 제사 유적으로 보아왔다. 원문 안에 쌍 십자를 그린 ‘전(田)’자를 네 개 붙인 것으로 후한(後漢) 때 허신(許愼)이 편찬한 자전(字典)인 ‘설문(說文)’은 이를 ‘뇌(壘)’자로 해석하고 있다.
‘누(壘)’는 또 군사의 성벽(壁)으로 ‘원왈군벽(垣曰軍壁)’으로도 해석되고 있으며 ‘주례(周禮)’에는 ‘영군지누사(營軍之壘舍)’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다. 또 나뭇가지와 같이 문양으로 네 군데를 구획한 것은 ‘방(邦)’과 ‘풍(豊)’으로 나라와 창고를 뜻한다는 것이다. 풍납토성 안의 주요한 군사시설과 창고로도 해석할 수 있는 문양이다. 이에 대해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풍납토성 출토 ‘田’문양 와당

풍납토성 출토 동진계 인면문 와당
북위와의 교류 보여주는 연화문 와당
또 하나 주목되는 와당은 바로 꽃잎이 6판인 연화문 와당이다. 박물관 유물 설명에는 ‘백제 와당’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유물은 한성백제 말기 중원의 강자 북위(北魏)와의 교류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연판 끝이 뾰족한이 와당은 중국 북위 유적에서 출토된 와당과 흡사하다.
백제는 4세기 후반 북위와의 교류를 놓고 고구려와 첨예하게 대립했다. 백제 개로왕은 고구려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동왕 18(472)년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고 장수왕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시기 북위의 불교문화가 일시 백제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북위 효문제(孝文帝)는 개로왕 편을 들지 않고 종전에 유대가 깊었던 고구려 편을 들어 백제는 이후부터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 2년 후 고구려 장수왕은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침입해 아차산 아래서 개로왕을 참수, 백제 한성시대 막을 내리게 했다.
고구려와 분쟁한 북위 영향 받은 연화문 와당
백제 초기 왕성 비롯해 불교 수용 역사 증명
한성백제 마지막 왕도, 건국대 북편 상정
건국대 캠퍼스 안 호수 일감호 발굴조사 필요
한성 백제시기 첫 도읍과 관련 풍납·몽촌토성은 전장 약 2.5㎞로 왕성의 면모로는 손색이 없다. 그러나 두 토성은 여름철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며, 당시 백제 왕도 위례성에 있는 백성들을 도성 안에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는 부족했다. 특히 적의 침공 등 유사시 도성 주민을 보호할 산성이 없다.
<삼국사기>에는 여러 차례 이도(移都)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제15대 진사왕 7(391)년 궁전을 수리하고 그 속에 연못을 파 기이한 금수와 초목을 길렀다”는 내용이 있다. 개로왕 당시 475년에는 “대대적인 궁성 수축 공사를 단행, 강변을 따라 나성을 쌓았는데 사성(蛇城)의 동쪽으로부터 숭산(崇山)의 북쪽에 이르렀다”는 기록을 보면 한성백제 마지막 왕도는 지금의 아차산 아래 건국대 캠퍼스 북편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중국 촐토 북위 연화문 와당

중국 촐토 북위 연화문 와당
한강변 마한의 땅을 빌려 건국한 온조왕 이후 약 200년, 풍납·몽촌토성에서 국력을 키운 백제는 4세기 하북 위례성인 지금의 건국대 방면으로 옮긴 것은 아닐까.
백제는 이곳에서 큰 도성을 구축했으며 화려한 궁전과 궁성 내 연못까지 마련해 강대한 국가면모를 구축했다. 그러나 고구려 장수왕과의 갈등으로 불시에 기습을 당해 한성 백제의 운명이 다했던 것이다.
필자는 건국대 안의 호수 일감호(一鑑湖)를 발굴조사해 삼국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한성시기 잃어버린 백제 왕도를 찾아 복원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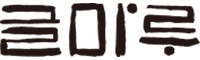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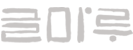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